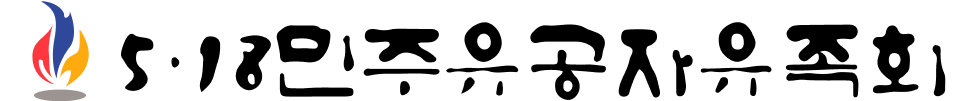
"44년째 응어리진 아픔"…민주묘지 찾은 5·18 참배객들 눈물(광주데일리뉴스)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4-05-20
조회수 : 593
"44년이나 흘렀으면 덤덤해질 법도 한데…. 5월의 아픔은 여전히 가슴을 미어지게 하네요."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
오월 영령을 추모하려는 참배객들로 가득했다.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었을 열사들을 잊지 않으려는 듯 이른 오전부터 참배객들이 묘역을 찾았다.
이들은 묘비에 적힌 열사들의 이름 석 자를 곱씹으며 참배했다.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제례 내내 붉게 충혈된 눈에서 눈물을 훔친 오월어머니지 회원들도 저마다의 아들·남편이 잠들어있는 묘역으로 이동했다.
묘비 한편에 놓인 초상화 속 앳된 얼굴의 남편을 하염없이 바라봤고, 밀려오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겠다는 묘역 앞에 주저앉기도 했다.
여든아홉의 나이로 핏덩이 아들을 보러 온 고(故) 김동수 열사의 어머니 김병순 씨도 거친 숨을 토해내매 묘역으로 이동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도중 헐떡이는 숨을 가다듬고선 "언제까지 올 수 있을까"라고 혼잣말하기도 했다.
생전 아들이 좋아했던 과일을 묘역 위에 가지런히 올려뒀고, 뾰족하게 자란 묘역 위 잡초를 손으로 잡아뗐다.
김 열사를 '집안의 대들보'라고 소개한 김병순 씨는 "힘겨운 집안 사정을 알뜰살뜰 살피며 동생을 돌보던 자상한 아들이었다"고 회상했다.
1980년 5월 19일 밤 계엄군의 발포로 남편 고(故) 김안부 열사를 잃은 김말옥(75)씨도 마른 눈물을 흘렸다.
"살다 보니 40여년이 흘렀다"는 말로 안부 인사를 건넸고, "홀로 4남매를 키우느라 힘들었는데, 보고 싶은 마음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며 울음보를 터트렸다.
유가족 외에도 오월 열사들을 기억하려는 일반 참배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5·18 왜곡 사례가 이어지자 역사 교육을 하기 위해 찾은 교사·초등학생, 5·18에 대해 최근에 알게 된 외국인들은 묘역을 둘러보고 헌화했다.
출처 : 광주데일리뉴스(http://www.gjdaily.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로 인해 기사 전체 내용 및 사진은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0